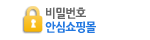- | 상품 상세 설명
![]()
이렇게 마주한 건 20년 만이었다.
고통뿐인 어린 시절, 유일하게 마음을 줬던 두 사람.
눈앞의 남자는 자신이 그 쌍둥이 중 한 명이라 말하고 있었다.
“예쁘네.”
“네?”
“예쁘게 컸다고.”
막연한 깨달음이 뇌리를 스쳤다.
저것은 가짜다. 가짜 웃음이다.
호수의 기억 속 쌍둥이는 그처럼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금세, 그의 말이 진실이길 바라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
“내가 백유진이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백해영?”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난 너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기회.”
그는 나에게 왜 이러는 걸까.
나는 왜 잡힌 손목을 뿌리치고 싶지 않은 걸까.
흔들리고 있는 호수의 귓가에 그의 목소리가 나직이 스며들었다.
“무서워하는 건 네 자유야. 하지만 도망치는 건 안 돼.”
![]()
요셉
김요셉(Joseph Kim).
2월 13일 물병자리.
서울 태생, B형.
[출간작]
포식자의 다섯 번째 손가락
플로리스트
문이 열리는 순간
그리하여 우리는 누군가의 별이 되고, 그리하여 우리는 누군가의 꽃이 된다
M에 관하여
스톤 차일드
![]()
“무서워? 내가 백유진이어도?”
호수는 고개를 번쩍 들었다. 한 번만 더 말해 주면 좋을 텐데. 그럼 거짓인지, 진실인지 알아볼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는 무감한 낯으로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웃지 않는 얼굴. 감정을 희석하는 웃음이 사라지자 그의 눈동자 이면에 깃든 본질이 얼핏 보인 것도 같았다.
“예쁘네.”
오롯이 그의 눈에 집중하느라 입술의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 곧장 받아들이지 못한 호수가 반사적으로 되물었다.
“네?”
“예쁘게 컸다고.”
호수는 타인의 눈만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얼굴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었다. 눈으로 보는 행위 자체를 거부했고, 특히 사람의 얼굴을 바로 보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었다. 호수가 당황해서 고개를 돌리려던 찰나, 해영이 손을 뻗었다. 손끝으로 내려가려던 턱을 받쳤다.
“피하지 마. 훔쳐보는 시선은, 정말 별로거든.”
똑바로 마주한 시선. 그러나 거짓을 나타내던 어둠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다고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의문이었다.
막연한 깨달음이 뇌리를 스쳤다. 거짓과 진실은 가늠해도 ‘진심’은 알아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더구나 개인의 기억을 토대로 구성된 진실 또한 객관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왜?”
“……네?”
“눈빛이 흔들리고 있잖아.”
턱을 받치고 있는 그의 손을 피해 호수가 고개를 모로 돌렸다. 턱에 닿아 있던 그의 손이 허공에 남겨졌다. 머리맡에서 짧은 웃음소리가 들렸으나 호수의 어긋난 시선은 정면으로 되돌아가지 못한 채 멈춰 있었다. 항상 꽁꽁 싸매기만 했던 호수는 난생처음 홀딱 벗겨진 것 같은 느낌에 지금 공황 상태였다.
어쩌지? 어쩌면 좋지?
용기는 바닥났고 마음은 버석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사위를 둘러봐도 보호막이 없었다.
“도망가고 싶은 건 알겠는데, 그건 좀 곤란해.”
“…….”
“내가 그렇게 성인군자는 아니거든. 나 죽었으면 하는 사람한테 친절하기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잖아.”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그는 이미 호수의 진의를 간파하고 있었다. 그가 백유진이기를 바랐다. 그 말은 곧 백해영이 죽었기를 바란다는 것이었다. 상처받고 싶지 않았을 뿐, 상처 입힐 생각은 없었다. 그 누구에게도. 그런데 제 감정에 취해 무작정 그에게 누구냐고 물었다. 그녀 안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었으면서.
“미, 미안해요. 그럴 생각은……”
“그럴 생각이 없었으면 나한테 연락을 안 했겠지.”
호수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한 두 손을 꽉 마주 잡고 입술을 짓씹었다. 그녀는 언제나 약자였고 피해자였다.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그녀에게 상처 준다 해도 자신은 그럴 수 없다고 여겼다. 아그네스 수녀님도, 태민도, 그녀를 치료하기 위해 애쓰는 진현까지도 다른 이들보다 나을 뿐 완전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애초에 그들의 인생에 자신의 자리가 있기를 바란 적 없었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상처 입혔다. 그것도 고의로.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호수는 멈추지 않고 사과했다. 그것 말고는 할 줄 아는 말이 없는 것처럼. 고개는 점점 더 수그러들고 어깨는 잔뜩 굽어 안으로 말렸다. 호수의 사과는 사죄에서 끝나지 않고 자학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정말 미안해?”
말려들어 간 호수의 어깨가 움찔 떨렸다. 호수는 연신 고개를 주억거리며 대답했다.
“……네, 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럼 벌을 받아야겠네.”
“네?”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하잖아. 안 그래?”
호수의 등이 굳었다. 학대가 새긴 고통의 기억은 수년이 지난 지금도 잊히지 않았다.
벌. 잘못을 했으면 받아야 하는 것. 어디로 숨어야 할까. 대체 어디로…….
주춤,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는 호수의 손목을 백해영이 낚아챘다. 호수는 입술을 짓씹었다. 기어이 입술에 피가 맺혔다. 무음의 비명이 터졌다. 세게 잡힌 것도 아닌데 뿌리칠 수가 없었다.
“무서워하는 건 네 자유야.”
“…….”
“하지만 도망치는 건 안 돼.”
그의 음성은 한없이 다정했다. 그래서 혼란스러웠다.
“나한테 원하는 게 있지? 내 죽음을 바란다면, 들어줄 수도 있어.”
뭐?
말의 의미를 파악하기에는 머릿속이 엉망진창이었다. 그가 유진일지도 모른다 했다고 그것이 해영의 죽음을 원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아니, 어쩌면 같은 의미인지 몰랐다.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 있기에.
“난 너에게 기회를 줄 생각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가질 기회.”
“……그런 거 없어요.”
해영은 머리를 가로저으며 부정하는 호수의 손목을 제 쪽으로 잡아끌었다. 힘없이 그의 앞으로 끌려간 호수는 숨을 멈췄다.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그가 나직이 속삭였다.
“아니, 있어.”
그것은 강력한 주문처럼 호수를 옭아맸다.
그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백유진과의 약속이었다. 호수는 제 손목을 붙든 커다란 손으로 시선을 옮겼다. 단단하고 차가운 손 위로 작고 여린 손이 겹쳐진다.
울컥, 가슴 깊은 곳에서 감정이 치민다.

- | 상품 문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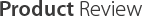
- | 상품 후기


 이미지 크게 보기
이미지 크게 보기